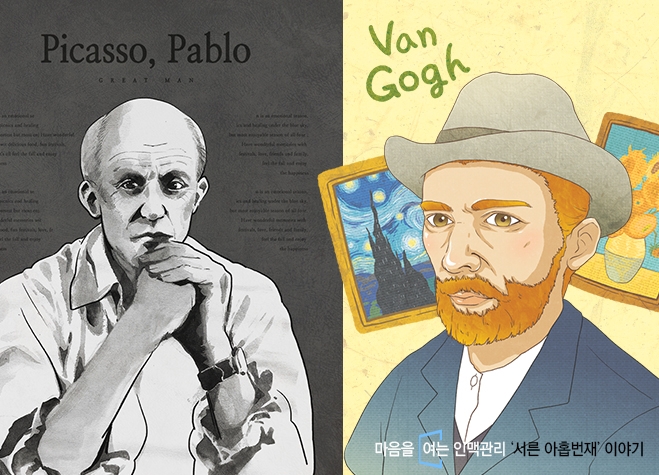
파블로 피카소와 빈센트 반 고흐 초상화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끝내 성공을 거두느냐 실패자가 되느냐는 그가 지닌 사회 지능의 두 가지 측면, 즉 익숙함과 평판에 달려있다.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구든 타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평판을 쌓아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낯설고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내놓더라도 사람들이 그의 평판을 믿고 흔쾌히 받아들여줄 것이다. 그러한 평판을 쌓은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익숙함’이다.
피카소는 이 두 가지의 대가였다. 그는 그림을 대량 생산해내어 예술계에서 친숙한 사람이 되었다. 반 고흐가 살아 생전 900점을 그린 반면, 피카소는 1만3천점의 그림과 약 300점의 조각을 창작한 다작의 예술가였다. 그리고 피카소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카리스마 때문에 그에게 매료되었다. 피카소는 키가 160센티미터밖에 안되었기에 외모는 그의 인기와 큰 관련이 없었다.
한편 반 고흐는 예술에 있어서는 반 고흐 못지않게 뛰어났지만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했다. 그는 폴 고갱과의 언쟁 끝에 귀를 잘라내기도 했다. 피카소가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를 부드럽게 순항하는 동안, 반 고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조차 고역스러워했다. 그는 이질적인 세계를 거부했다.
그러나 피카소는 ‘인간자석’이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기에 세상이 그의 손바닥에 있었다. 그의 관점에서 세상은 점점 좁아졌다. 피카소는 조직의 중심점이었고 ‘커넥터’이자 ‘설득가’였다. 그는 보기 드문 사교기술로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세상을 점점 좁혀나갔다.
오늘날 세상을 측정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쉽게 찾아내는 가이다.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몇 명의 지인만 존재하는 괴로운 세상에서 그림을 그렸던 반 고흐에게는 그의 그림을 사줄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 멀리 있었다. 반 고흐는 남동생을 통해서 예술계와 주로 연결되었는데 그 연결이 그에게 생생한 성공을 안겨 줄 돈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지는 못했다.
피카소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다. 예술가, 작가, 정치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가 절대 세상의 중심에서 동떨어진 인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피카소처럼 높은 생산성과 세상에 대한 노출을 통해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에게 익숙해지게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평판을 쌓아 사람들이 경계심을 허물고 호의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했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중요성
인간의 두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익숙함은 뭔가에 호감을 갖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그 뭔가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코넬대학교의 컴퓨터과학자인 존 클레인버그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무작위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메시지의 성공적인 전달을 위해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가’와 같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아야 했다.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익숙해져야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비밀수첩의 역할을 하는 그림자 네트워크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피카소는 폭넓고 익숙한 인간관계인 그림자 네트워크로 좋은 평판을 만들었고, 고흐는 그렇지 못했다.
출처: 상식파괴자(그레고리 번스 지음)
윤형돈 FT인맥관리지원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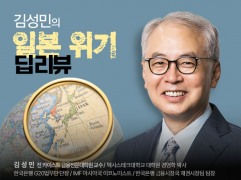

















![[DCM] 한화시스템, FCF 적자 불구 시장조달 자신감](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0204171101504a837df6494123820583.jpg&nmt=18)
![‘리니지 제국'의 부진? 엔씨의 저력을 보여주마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0123095403419dd55077bc211821821443.jpg&nmt=18)


![[DCM] CJ, 올리브영이 끌어올린 가치…발목 잡는 ENM·CGV](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0204201902554a837df6494123820583.jpg&nmt=18)












![[카드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202163815644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28145611902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141153149784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07163026376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061649137526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신간] 고수의 M&A 바이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091008414900330f8caa4a5ce12411124362.jpg&nmt=18)
![[신간] 리빌딩 코리아 -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032814555807705f8caa4a5ce12411124362.jpg&nmt=18)
![[서평] 추세 매매의 대가들...추세추종 투자전략의 대가 14인 인터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3102410444004986c1c16452b0175114235199.jpg&nmt=18)

![[신간] 이게 화낼 일인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6010610254801367f8caa4a5ce12411124362.jpg&nmt=18)
![[신간] 조금 느려도 괜찮아...느림 속에서 발견한 마음의 빛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110508223906285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현대차, 글로벌 안전평가 최고등급 달성 기념 EV 특별 프로모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10616064705033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AD] 현대차 ‘모베드’, CES 2026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신상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10510341300371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AD] 기아 ‘PV5’, 최대 적재중량 1회 충전 693km 주행 기네스 신기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110511521506728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241142445913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AD]‘황금연휴에 즐기세요’ 기아, ‘미리 추석 페스타’ 이벤트 실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03093618029117492587736121166140186.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