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가 출범시킨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 후 4년 동안 강제조사는 단 3건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에서 강제조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금융위 사무처 소속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는 출범 이래 2015년 2건, 2016년 1건에 불과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실적은 30여 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 초기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정 대처 주문 이후 금융위는 2013년 9월 17일 사무처 소속 상설 기구로 자조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금감원을 두고 유사한 조직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출범 당시부터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조직 출범 전 금융위가 2013년 4월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금융위가 필요성을 주장한 금감원 파견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지명은 2015년 사법경찰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금융위 소속 자조단에 배치된 공무원들만 전원 강제조사(압수수색) 권한을 지닌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했다.
그는 "당초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비롯해 금감원 직원까지 특사경 지명을 추진하겠다던 금융위는 아직까지 특사경을 한 명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특사경을 도입할 만한 급박한 사유가 없다"고 최 의원에게 답했다.
최 의원 측은 당초 입장을 바꿔 특사경 지명을 거부한 채 금융위 공무원에게만 독점적으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조단의 직무 수행에 강제조사권한이 필수적이지 않거나, 조사인력 증원을 해야 할 만큼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단독 조사보다 실적 줄어
여기에 자본시장조사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자조단이 정작 조사 역량이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조단과 금감원 두 기관의 조사 착수 실적을 모두 합해도 이전 금감원만 단독으로 조사하던 때보다 착수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조단이 없던 2013년 220건에서 2016년 203건으로 줄었다. 2013년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금감원에 특수조사국을 증설하고, 별도로 자조단까지 신설했지만 의외의 결과라는 것이 최 의원의 견해다.
그는 "같은 기간 인지·접수되는 사건 수가 줄지 않았다"며 "통계상 잡힌 접수 건수만 해도 거래소에서 통보되는 사건 수와 두 조직의 자체 인지 건수를 합해보면 금감원이 단독으로 조사 업무를 하던 2013년 186건에 비해 2014년 192건, 2015년 199건, 2016년 22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건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인해 착수 사건 당 조사기간이 늘어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당 조사 착수 건수 기준은 금감원이 제한된 조사권한을 갖고도 연간 1인당 1.5~2건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자조단은 출범 이후 매년 줄곧 1인당 1건도 채우지 못 했다.
조사 착수 사건의 처리 실적 역시 자조단의 경우 2014년 14건 중 12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으나, 2015년에는 15건 중 6건(40%), 2016년에는 20건 중 9건(45%) 조치에 불과했다. 반면 금감원은 착수 건수(169건)보다 조치 건수(171건)가 많았던 2014년을 제외해도 2015년 165건 중 125건(76%), 2016년 183건 중 149건(81%)을 조치했다.
최 의원은 "자조단의 역할이 실제로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과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금감원 사이에서 모호하다"며 "실제 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조사권한 독점 등을 통한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에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합의제 심결기구인 금융위가 실효성 애매한 부서를 사무처에 거느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율적인 규제 관점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조직은 정리해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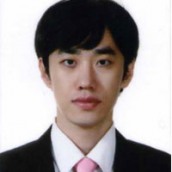






















![기관 '한미반도체'·외인 'NAVER'·개인 '삼성전자' 1위 [주간 코스피 순매수- 2026년 1월26일~1월30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13022473402636179ad439071182357237.jpg&nmt=18)
![기관 '에코프로'·외인 '에코프로'·개인 '알지노믹스'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6년 1월26일~1월30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13022563407542179ad439071182357237.jpg&nmt=18)
![12개월 최고 연 3.20%…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2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130181142061535e6e69892f18396169112.jpg&nmt=18)
![[주간 보험 이슈] 예별손보 예비입찰자 한투·하나금융·JC플라워…완주 가능성은 外](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01205414020408a55064dd1106248197152.jpg&nmt=18)
![24개월 최고 연 5.15%, 제주은행 'MZ 플랜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2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130182912042895e6e69892f18396169112.jpg&nmt=18)
![24개월 최고 연 2.90%…부산은행 '더 특판 정기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2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130181253004825e6e69892f18396169112.jpg&nmt=18)
![12개월 최고 연 4.95%, 제주은행 'MZ 플랜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2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130182812032595e6e69892f18396169112.jpg&nmt=18)
![24개월 최고 연 3.10%…진주저축은행 안심정기예금[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2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0118584200659957e88cdd5211234196184.jpg&nmt=18)
![메타리치 MZ 설계사 직영조직 실험…MAP그룹 압도본부 [게임체인저 GA]](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01132221019598a55064dd11251906169.jpg&nmt=18)
![12개월 최고 연 3.20%…NH저축은행 'NH특판정기예금(비대면)'[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2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0118483800519957e88cdd5211234196184.jpg&nmt=18)












![[카드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28145611902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141153149784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07163026376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061649137526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509241142445913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신간] 고수의 M&A 바이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091008414900330f8caa4a5ce12411124362.jpg&nmt=18)
![[신간] 리빌딩 코리아 -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032814555807705f8caa4a5ce12411124362.jpg&nmt=18)
![[서평] 추세 매매의 대가들...추세추종 투자전략의 대가 14인 인터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3102410444004986c1c16452b0175114235199.jpg&nmt=18)

![[신간] 이게 화낼 일인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6010610254801367f8caa4a5ce12411124362.jpg&nmt=18)
![[신간] 조금 느려도 괜찮아...느림 속에서 발견한 마음의 빛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110508223906285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현대차, 글로벌 안전평가 최고등급 달성 기념 EV 특별 프로모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10616064705033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AD] 현대차 ‘모베드’, CES 2026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신상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10510341300371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AD] 기아 ‘PV5’, 최대 적재중량 1회 충전 693km 주행 기네스 신기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110511521506728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241142445913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AD]‘황금연휴에 즐기세요’ 기아, ‘미리 추석 페스타’ 이벤트 실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03093618029117492587736121166140186.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