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에 맞게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걱정 돼
근사한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한번쯤은 그 정확한 의도와 효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연히 노동부에서 운용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위한 사이트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사이트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사업을 말한다는 추가적인 설명도 더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 가운데 하나인 루비콘 사의 한 관계자 이야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이란 아이디어는 2003년 노동부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다. 당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전번 정권에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구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렇게 사업이 확장하게 된 데는 역시 특정한 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2005년 3월부터 ‘사회적 일자리T/F’를 구성하고 2006년에 시작해서 2007년 1월 3일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마련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같은 해 6월말에 마무리한 바가 있다. 법이란 것이 일단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관련부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NGO들도 좋은 명분 아래에 득을 보기 때문이다.
2003년에는 노동부가 단독으로 73억원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8개 부처와 11개 부처가 참가하여 예산만 6,782억원과 1조 2,94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노동부 예산만 1,215억원을 투입하여 422개 단체에게 14,209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을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노동부 예산만으로 미루어 보면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재정지원이 1천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NGO)는 근로자 1인당 78만 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사회보험료 8.5%를 지원받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누구도 그 공과를 정확하게 따져볼 기회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들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계층이나 단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웬만해서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점점 그 범위와 폭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자는 기업 이면 사기업, 공기업 등과 같이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비영리단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언어라는 것은 묘하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사적 기업 혹은 전통적인 기업에 비해서 더 근사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실제를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리라 본다. 사회사업이라면 이따금 경제적인 논리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경제적인 잣대를 사용하게 되면 사적 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적 영역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단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고민해 봐야 한다. 물론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들고 나온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기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사업이 단기에 그친 저임금 자리를 제공하고 만다는 고민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한 재정지원이 이런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그냥 좋은 의도 하에서 확보된 예산을 특정 단체들이 나누어 갖는 그런 결과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이 앞선다. 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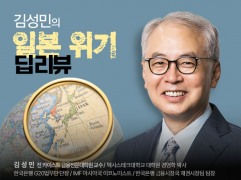













![[ECM] 롯데글로벌로지스·DN솔루션즈, 스토리 부재에 IPO 발목](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050212361900222a837df64942192515869.jpg&nmt=18)
![[DQN] 하나캐피탈, 지난해 연봉 대비 1인당 생산성 1위 탈환...기업금융 중심 IBK·산은·신한캐피탈 상위권 안착 [금융권 생산성 랭킹 - 캐피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0501071131069756a663fbf34175192139202.jpg&nmt=18)

![영등포 '광장' 59평, 23.2억 오른 38.5억에 거래 [일일 아파트 신고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050209232501487e41d7fc6c2183101242202.jpg&nmt=18)
![[데스크 칼럼] AI 에이전트, K금융의 판을 다시 짠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05022056160633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5월 1주 청약일정] 대선 전 분양 움직임 분주…전국 6곳 2602가구 접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5050216434207994e41d7fc6c2183101242202.jpg&nmt=18)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503261121571288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403221529138957c1c16452b0175114235199_0.png&nmt=18)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40131105228940de68fcbb35175114235199_0.jpg&nmt=18)
![[신간] 리빌딩 코리아 -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032814555807705f8caa4a5ce12411124362.jpg&nmt=18)
![[신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와 검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011710043006774f8caa4a5ce12411124362.jpg&nmt=18)
![[서평] 추세 매매의 대가들...추세추종 투자전략의 대가 14인 인터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3102410444004986c1c16452b0175114235199.jpg&nmt=18)

![[신간] 똑똑한 금융생활...건전한 투자와 건강한 재무설계 지침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5031015443705043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3261121571288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AD] 기아, 혁신적 콤팩트 SUV ‘시로스’ 세계 최초 공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4123113461807771f9c516e42f12411124362.jpg&nmt=18)
![[AD] 아이오닉5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기네스북 올랐다...압도적 전기차 입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4123113204707739f9c516e42f12411124362.jpg&nmt=18)




